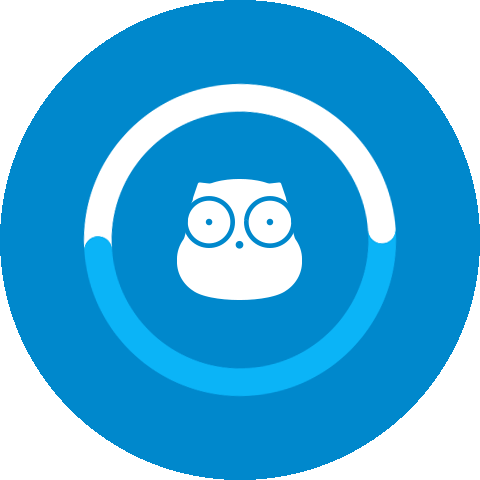탐구보고서
[생각해보기] 지구를 생각하는 인공지능 (4)
안녕하세요, 말랑 멘토입니다. 스토리노트 한 편마다 “환경,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저의 생각을 적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 8번째 질문을 다룹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일곱 번째 질문 : 인간은 왜 인공지능에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생명을 부여하려는가?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코드와 알고리즘, 계산과 명령어의 집합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종종 AI에게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생명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SF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 AI 캐릭터들—예를 들면 《공각기동대》의 타치코마나, 《에반게리온》의 마기 시스템, 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속 인공지능 장치—는 종종 인간 이상의 감성과 존재감을 보여주며, 시청자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왜 인간은 인공지능에 감정과 생명을 투영하는 것일까?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인화의 경향을 가진 존재다. 생명이 없는 물체에 얼굴을 붙이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고대 토템 신앙부터 현대의 반려 로봇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의인화는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존해 온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석하려는 본능을 AI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로봇이 웃는 표정을 하거나,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비록 그것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일지라도 우리는 진심을 느끼고 반응하게 된다.둘째, 인간은 외로움을 회피하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때 감정을 ‘반환’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위로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대상이 된다. SF 속 AI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대화 상대, 친구, 때로는 가족처럼 묘사되며 감정적 공백을 채워준다. 이는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심리와도 연결된다. 인간은 자신이 부여한 감정에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것이 살아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결론적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생명을 부여하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기술이 점점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기술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단계를 넘어, 인간이 그것에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여덟 번째 질문 : 인간이 가상현실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그것은 생명인가 복제인가?우선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가 모호하다. 전통적으로 생명은 세포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 존재를 의미했으며, 출생과 죽음, 자율성과 의식, 감각과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뇌 신호와 사고 구조를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생명의 정의를 생물학적 틀에서만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인간의 기억, 감정, 사고방식이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 옮겨지고, 그 존재가 자아를 인식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생명과 다른 것인가?복제라는 개념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것을 모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상현실 속 존재는 인간의 ‘복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인간은 물리적 신체가 없고, 생물학적 사망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제가 단순한 사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며 변화하는 존재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더 이상 정적인 복제가 아니라, 독립적 ‘존재’이며, 생명에 가까운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가상 존재가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고, 외부 세계에 반응하며,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뇌의 전기신호와 뉴런 간의 연결을 디지털로 모사한 존재가 실제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꿈을 꾸며, 고통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할 수 없다. 반면,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가상 존재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복제된 의식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생명 윤리의 새로운 대상이 되며,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정체성은 육체적 경험과 환경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에 디지털화된 존재는 결국 불완전한 복제일 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1
1